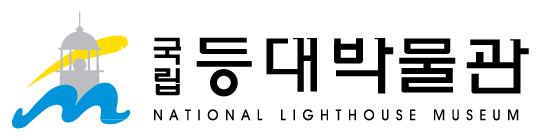아마추어 사진동호회의 총무, K의 전화를 받은 건 며칠 전이었다. 모처럼의 통화였지만 K의 목소리는 어제 만나 소주라도 나눈 사이처럼 정겨웠다. “형님, 날도 슬슬 풀리는데 주말에 섬 출사 한번 갑시다.” “섬 출사라…. 어디로 갈 건데?” 섬이라는 말에 솔깃해진 나는 전화기를 바짝 끌어당겼다. “안면도가 어떨까 하는데요. 회도 좀 먹고 일몰이나 몇 장 건져올까 해서….” “에끼, 이 사람아. 안면도가 어디 섬인가? 육지지….”
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동참을 선언해버리고 말았다. ‘섬 여행’이란 말은 주말 휴식을 포기하기에 충분할 만큼 매혹적이었다. 전화를 끊고서도 꽤 오랫동안 섬이란 단어가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. 내게 섬의 이미지는 젊은 날에 각인된 한 장면이 전부다. 어느 한순간 흑백의 영상으로 내 안에 들어앉은 섬은, 세월이 가도 퇴색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.
1970년대 말의 터널 속 같았던 시절. 스무 살의 나는 날마다 절망하고 분노했다. 돌멩이 따위로는 무너지지 않는 독재자, 그 앞에 굴종하고 아부하는 인간군상, 가난, 앞이 안 보이는 미래, 휴지처럼 구겨진 꿈…. 궁극적인 분노의 대상은 용기 없는 나 자신이었다.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수시로 찾아왔다. 비척거리며 걷는 나날이었다.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술에 취해 잠드는 것이었지만 호주머니에는 먼지나 서식할 뿐이었다.

그 해에는 종강을 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배낭 하나 메고 길을 떠났다. 시위하다 잡혀가 차가운 시멘트바닥에서 공포와 싸우고 있을 친구들, 돈 몇 푼을 위해 찬바람에 몸을 내맡기고 있을 부모님…. 발길은 납덩이를 매단 것 같이 무거웠지만, 또 그런 현실은 비겁한 젊은이의 등을 자꾸 떠밀었다. 장항선 열차를 타고 대천에 도착, 어항(대천항)이란 곳에서 배를 탔다. 그리고 원산도를 거쳐서 삽시도에 도착했다. 삽시도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 아니었다. 누구에겐가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섬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찾아간 것이었다.
배에서 내리는 순간 다른 세상에 들어선 느낌이었다. 삽시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태초의 모습에 더 가까운, 전혀 개발되지 않은 섬이었다. 선착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집에 들어가 묵을 것을 청했다. 평생 파도와 싸우며 살아온 듯한 주인은 두말없이 바깥채의 방 하나를 내주고 불을 지펴주었다. 그렇게 섬에서의 생활은 시작되었다. 날이 밝으면 바닷가로 나가 무작정 걸었다. 될 수 있으면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. 외지사람이라고는 나 하나 뿐인 섬의 겨울바다는 적막했다. 사람 발자국 하나 없는 백사장, 해안선을 따라 병풍처럼 둘러쳐진 해송과 기암괴석, 하늘을 나는 갈매기….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름다웠고, 만나는 사람들의 눈은 순박하고 따사로웠다.

그런 날들을 보내다 보니 내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. 가슴의 통증은 조금씩 줄어들고 막연한 분노도 가라앉았다. 밤새 파도가 친 다음날 아침의 잔잔한 바다 같은 평화가 거기에 있었다. 자연의 힘? 난 지금도 뚜렷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. 분명한 것은 바다와 섬 그리고 섬사람들, 그들은 회초리나 잔소리 없이도 한 젊은이의 치기 어린 성장통을 치료했다는 것이었다. 통증이 사라진 자리에 부끄러움이 찾아왔다. 추위 속에서도 새벽부터 배를 타고 나가거나 뻘을 뒤지는 섬사람들을 보며 내 투정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깨달을 수 있었다. 결국 얼마 못 가 배낭을 꾸리고 말았다.
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섬을 생각한다. 그리고 그 곳으로 달려가고 싶다는 열망에 시달린다. 하지만 실행은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. 어쩌면 확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. 잘못하면 가슴에 간직해온 아름다운 꿈 하나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, 어부의 초막이 있던 자리에 펜션의 불빛이 번쩍일지도 모르는 걱정. 그런 것들이 내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것일 게다. 정은 사라지고 사람 하나 하나가 섬처럼 홀로 떠도는 시대를 살면서, 환상 같은 기억 하나쯤은 영원히 품고 싶은 것일지도….